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어 “둘씩 짝지어”(마르 6,7) 파견하셨다 한다. “둘씩 짝지어”라는 말씀을 읽으면 나는 거의 반사적으로 헨리 나웬 신부님께 첫 편지를 쓰게 했던 나의 젊은 날이 생각난다.
예수님께서 혼자가 아니라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신 까닭은 신명 19,15 마태 18,16 2코린 13,1 등에 따라 제자들이 복음의 ① 증인으로서 그들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증언의 유효성 입증을 위한 최소의 복수複數 단위였기 때문이고, ②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마태 18,20) 하신 말씀에 따라 당신께서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숫자이기 때문이며, ③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실 때(참조. 마르 1,16-20) 네 제자를 짝을 지어 만나시고 부르셨던 것을 생각하게 하는 수이기 때문이다.
또한 제자의 파견 단위가 둘인 것은 그 뜻으로 보아서 일치를 위한 최소한의 복수이며, 복음 선포가 반드시 공동체의 표현이어야만 하기 때문이고, 나아가 복음 선포는 반드시 누군가와 같은 내용을 공유하는 삶이 전제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둘, 혹은 둘 이상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창세 2,18)에 따라 좋지 않음을 피하기 위한 수, “혼자보다는 둘이 나으니……세 겹으로 꼬인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코헬 4,9-12) 하는 말씀에 따라 상호 의지하며 함께 있어 끊어지지 않기 위한 수이기 때문이다.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 파견하신 내용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여 이를 준수하려고 부단히 애썼다. 짝지어 파견된 제자들이 가는 초대교회의 길은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가는 길(사도 3,1), 함께 달려 빈 무덤으로 가고 다시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요한 20,1-10), 바르나바와 사울이 함께 가는 길(사도 11,30), 유다와 실라스가 함께 가는 길(사도 15,22), 바르나바와 마르코가 함께 가는 길(사도 15,39), 바오로와 실라스가 함께 가는 길(사도 15,40)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의 첨탑도 짝을 지어 짓고 싶어 했다.(*이미지-구글)

***
헨리 나웬 신부, “주님의 이름으로”
1989년 가을, 나는 첫 서원 때부터의 소원이었던 선교사로서의 꿈을 이루게 되면서 눈물과 아쉬움 속에, 그런데도 사제로서는 아프리카 땅에 첫발을 디디는 첫 한국인이라는 열렬한 군중의 격려와 환송 속에 거의 영웅이 되어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로 향할 수 있었다. 그러나 허물 많은 젊은 날, 광대 쪽이어야 할 자신의 신분을 잠시 잊어버렸으며 내가 스타라는 착각 속의 선택이었으므로(참조.광대 http://benjikim.com/?p=5265) 1년도 채우지 못한 1990년 말 내 딴에는 떠날 때보다 훨씬 더 큰 용기를 내어 다시 한국으로 되짚어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떠날 때의 결심과 환송이 그렇게 큰 것이었다고 한다면, 눈물지으며 돌아와 김포 공항에 홀로 내렸을 때의 착잡함과 썰렁함은 훨씬 더 큰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쩌면 처절함이었다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일지도 모른다.
돌아와서 갈팡질팡 마음을 잡지 못하면서 수도원에 돌아가기를 머뭇거리며 지내던 그 무렵 어느 날, 전남 순천에 살고 있던 누나네 집에 무슨 일인가 볼 일이 있어서 가던 날이었다. 출발 직전 만난 미국인 권선호 신부님께서 아직 당신도 읽지는 않았노라 하시면서 책 한 권을 주셨는데, 무심코 받아든 책이 헨리 나웬 신부님의 “In the name of Jesus(주님의 이름으로)”였다. 순천에 가기 위해 여수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 위에서 읽기 시작했던 81쪽짜리 작은 영어책은 나를 거의 미치도록 열중하게 했다. 순천 누이 집에서의 모든 일마저도 제쳐놓고 2층 방에 올라가 새벽까지 그 책을 단숨에 다 읽었다. 그리고는 그 책이 주는 감동으로 벅차오르는 흥분 속에서 책의 앞장을 뜯어 다짜고짜로 그 책의 출판사인 뉴욕의 Crossroad 출판사로 저자에게 전해 달라는 겉봉과 함께 편지를 썼다. 편지의 내용은 대충 “너무나도 큰 감동을 주었던 당신 책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 년 전부터 책으로만 당신을 만나왔던 애독자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그 귀한 소명으로 은총과 축복 속에 계속하여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라는 것이 요지였다. 그 책이 그토록 내게 강렬하게 다가왔던 것은 부르심을 받은 처지대로 공동체 안에 짝지어 존재했었어야 할 신분임에도 이미 저지른 젊은 날의 수많은 아픔, 외로움 속에서 엉뚱한 짝을 찾으며 방황하고 있던 나를 인도하시려는 섭리였다. 그 섭리의 그물은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야 뭍으로 끌어 올려질 것이었다. 나는 서품 기념 상본에 “주님께서 각자에게 정해 주신 대로, 하느님께서 각자를 부르셨을 때의 상태대로 살아가십시오.”(1코린 7,17)라는 구절을 새겼었다.
헨리 나웬 신부님께 드린 첫 번째 편지로부터 시작하여 난 그분이 몇 개의 박사학위도 가지신 분이고, 하버드, 예일, 노틀담 등 유명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셨던 분이며, 1985년에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철학 교수였던 쟌 바니에(Jean Vanier) 박사가 세웠던 정신 지체 장애를 지닌 이들을 위한 라르쉬(L’arche) 공동체 체험을 불란서에서 가진 뒤, 1986년부터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라르쉬 공동체 중의 하나인 “새벽(Daybreak)”이라는 공동체에서 거주 사제가 되었으며, 또 그렇게 살아가시던 중에 갈비뼈가 5개나 부러진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는 것을 알았다. 이 모두가 1년에 한두 번 오간 편지, 신간이 나올 때마다 저자 서명과 함께 받았던 그분의 책들, 여기저기에 난 그분에 관한 기사들, 누나 집이 있던 토론토 방문 때마다 찾았던 ‘새벽’ 공동체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신부님과의 소중한 인연들이다.
아프리카에서 1년도 못 채우고 돌아와 좌절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나에게 밤을 꼬박 새우도록 감동을 주었고 신부님과의 만남을 시작하게 했던 “주님의 이름으로”라는 책의 사연은 이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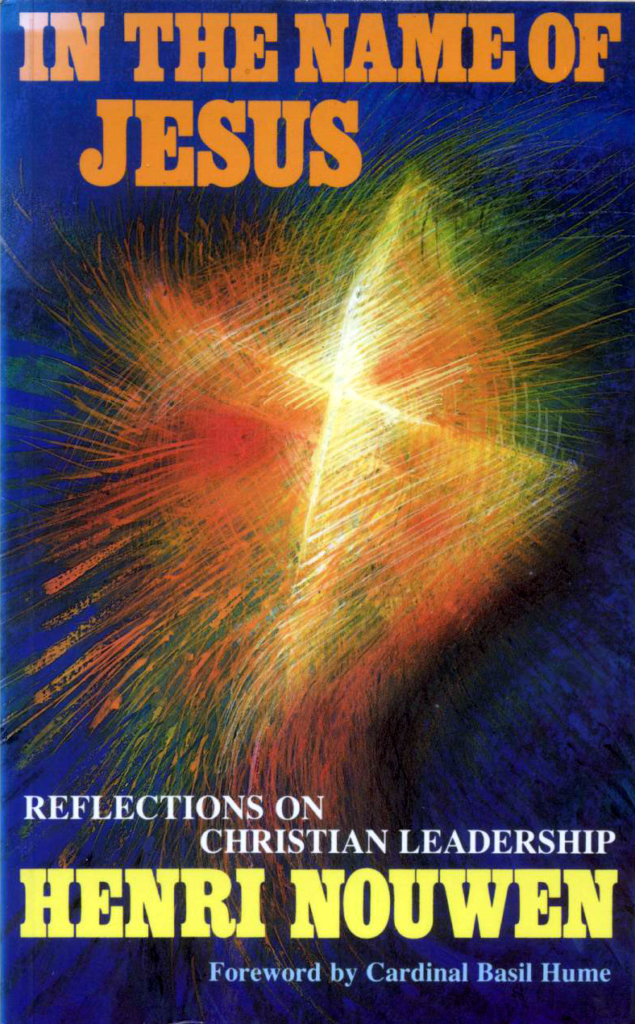
헨리 나웬 신부의 친구인 머리 맥도넬(Murray McDonnell)이라는 분이 토론토 근교의 “새벽” 공동체를 방문 했을 때, 워싱턴DC에 있는 “인간 개발센터(Center for Human Development)” 창설 15주기 기념 강연으로 “21세기를 맞는 크리스챤 리더쉽”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 줄 수 있겠느냐는 부탁을 한다. 헨리 신부님은 그 센터의 창설자인 빈센트 듀이(Vincent Dwyer) 신부와도 잘 아는 사이이고, 주제도 맘에 들고 해서 그 강의를 해 주기로 수락하고 준비에 들어갔다. 강의를 준비하던 중에 헨리 나웬 신부님은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짝지어 파견하셨는데 왜 나는 누구와 “함께” 이 강의를 해낼 수 없는가를 고민하게 되었고, 몸담고 있던 “새벽” 공동체의 정신 지체 장애 형제들과 이를 상의 하였으며, 그러한 발상에 공감한 공동체는 빌 반 버렌(Bill Van Burren)이라는 장애인과 그 강의를 함께 해내도록 결정하였다. 나웬 신부는 당시 신자도 아니었던, 그리고 떠듬거리는 말 몇 마디만을 할 수밖에 없었던 빌에게 세례를 주었고, 함께 첫영성체에 이어 견진성사까지 준비하고 있던 처지였었다. 그러한 빌과 함께 나웬 신부님은 함께 강의하기로, 함께 복음을 선포하러 워싱턴으로 날아가기로 의기투합하게 되었는데, 정말이지 빌은 처음부터 자신이 나웬 신부의 그 강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굳게 확신한듯하였다.
마침내 워싱턴으로 날아가던 날 비행기에 오르면서 빌이 나웬 신부에게 건넸던 말은 “우린 정말 이 일을 함께하려는 거야. 그렇지?”였었고, 나웬 신부의 대답은 “그럼, 빌, 그렇고말고”였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강의가 총 3장으로 된 “주님의 이름으로”라는 책이다. 그 책의 마지막 부분인 에필로그에 헨리 나웬 신부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강의를 시작하는 그 순간까지도 난 여전히 빌과 “함께” 강의를 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었다. 그러나 내가 입을 열기 시작하자마자 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난 무척 기뻤다. 난 손수 썼던 강의록을 펼쳐 들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자 자기 자리에 앉아있던 빌이 일어나서 내 뒤편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런 행동은 사실 “함께 한다”라는 의미를 빌이 나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까닭이었다. 내가 강의록의 한 페이지를 끝낼 때마다 빌은 그 강의록을 받아서 연단 바로 옆에 있던 작은 책상에 가지런히 놓았다. 이 단순한 작업은 빌의 현존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고 있음을 느끼게 하기 시작하였다. 아마 빌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마음에 느끼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내가 돌을 빵으로 만들고 싶은 유혹에 관한 부분을 시작했을 때 빌이 모두가 들릴만한 큰 소리로 “나 그것 지난번에 들었어”라고 소리쳤다. 물론 나와 함께 살고 있기에 그런 강의나 강론을 빌이 틀림없이 들었을 텐데, 빌의 의도는 그저 나와 자기가 함께 살고 있고, 내 생각이나 생활에 대해 자기가 알고 있음을 청중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빌의 그러한 말은 내가 청중들에게 새로운 이야기인 양 떠들어대는 것이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님을 깨우쳐주는 사랑에 찬 메시지였다.
빌의 개입은 청중들에게 무겁고 진지한 분위기를 일시에 좀 더 가볍고, 쉽고, 즐거운 강의가 되게끔 바꾸어 놓고 말았다. 빌은 다소 딱딱한 분위기를 한순간에 날려버리고 편안한 일상사의 대화 순간으로 청중과 나 모두를 바꾸어 놓았다. 강의를 진행해 가면서 나는 빌과 “함께” 강의를 하고 있음을 더욱 느끼게 되었고 이는 정말 멋진 체험이었다. 내가 강의의 두 번째 부분을 읽기 시작하면서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정신 지체 장애인들에게 가장 많이 제기되는 물음은 ‘당신은 오늘 밤 집에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라는 대목을 읽을 때 빌은 다시 한번 내 강의에 끼어들었다. “그 말이 맞아. 죤 스멜쳐가 언제나 그렇게 묻곤 하지.”라고 말하고 나섰던 것이다. 빌은 사실 이미 죤 스멜쳐와 몇 년 동안 살고 있던 터라 그를 잘 알고 있었다. 빌은 그저 자기 친구에 대해 청중에게 알리고 싶었다. 이러한 빌의 두 번째 끼어들기는 청중들을 다시 한번 우리 쪽으로 이끌어 우리 공동체의 생활과 친근하게 느끼게 했다.
내가 강의를 모두 마치고 사람들이 고맙다고 말하고 있을 때 빌이 내게 물었다. “헨리, 이제 내가 말해도 돼?” 나의 내심 첫 번째 반응은 “어떡하지 이 상황을, 어쩌면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릴지도 모르는데….”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빌의 입장에선 별 중요하게 얘기할 거리가 없으리라는 생각으로 나의 선입견을 교정하면서 청중에게 “빌이 몇 마디 하고 싶답니다. 잠깐 앉아 주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요청했다. 마이크를 잡은 빌은 매우 떠듬거리는 어려운 상태로 “지난번 헨리 신부가 보스턴에 갔을 때 그는 죤 스멜쳐와 같이 갔었어요. 이번에는 나하고 같이 워싱턴에 온 거예요. 난 무척 기뻐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말뿐이었다. 그러자 청중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빌에게 큰 박수를 보내 주었다. 강연장을 빠져나오면서 빌은 내게 “헨리, 내 연설 어땠어? 괜찮았어?”라고 물었고 나는 “대단했어. 네가 말한 것을 듣고 모두가 무척 기뻐했지.”라고 대답했다. 빌은 정말 기뻐했다.
강연장 밖에서 사람들이 음료수를 마시며 자유롭게 웅성거리고 있었는데, 빌은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면서 자신을 일일이 소개하고 강의가 어땠느냐고 묻기도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새벽’ 공동체의 온갖 이야기를 떠벌리고 있었다. 한 시간 이상 난 그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도 없었다. 빌은 정말 모든 사람을 알기 위해 무척 바빴다. 다음 날 우리가 떠나기 전 아침 식사 때는 커피잔을 손에 든 채 빌이 전날 저녁에 알게 되었던 모든 이에게 하나하나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다. 나보다도 빌에게 더 많은 친구가 생겼음에 틀림이 없었다. 그리고 집 밖의 비일상적인 그런 자리에서 그는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집”을 느끼고 있었다.
토론토로 돌아오던 비행기 위에서 빌은 그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들고 다니던 낱말 맞추기 게임집을 손에 들고서 내게 물었다. “헨리, 우리 여행 즐거웠어?” 그래서 내가 “그럼, 굉장했지. 나와 함께 와줘서 정말 고마워.”라고 응답했고, 빌이 나를 찬찬히 되돌아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함께해낸 거지? 그렇지?”라고 다시 물었고, 비로소 나는 그 순간, “내 이름으로 둘 셋이 함께 모인 곳에 나도 함께하겠노라.”(마태 18,19) 하시던 주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
과거에 나는 강의나 강론, 각종 수많은 연설을 준비하면서 언제나 나 스스로 혼자 해냈었다. 가끔 나는 내가 했던 수많은 말들이 언제 어디서 얼마나 기억될까를 의아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온갖 말들이나 생각들이 사람들 가슴 속에 그렇게 오래 남아 있지 않으리라는 것도 안다. 그러나 빌과 내가 이번에 함께했던 그 강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쉽게 잊히지 않을 것임을 믿는다. 우리를 함께 보내셨고 우리의 이번 여행에 내내 함께하셨던 주님께서 참으로 이번 강의에 왔던 많은 이들의 삶에도 함께 현존하시길 기도한다. 비행기가 도착했을 때, 난 “빌, 나와 함께 가줘서 정말 고마워. 여행이나 강의 모두가 정말 멋졌어. 우린 주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함께한 것이야.”라고 빌에게 말했고, 그 말은 말 그대로 나의 진심이었다.」
지난번 복음 말씀에서
둘씩 짝지어 파견하신다 그 부분이
맘 속에 남았는데.
오늘 신부님의 아프리카 파견 일화까지
알게되었네요.
나웬 신부님의 에피소드도 감동적입니다.
인생은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나 봅니다.
오늘 말씀에 조금 아주 조금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wosome place.. is the place indeed where we could meet HIM. We call it the other way around – the Church.
아, 이 글! 이 단순하고 깊은 아름다움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