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샘할 투妬’에는 글자의 뜻을 나타내는 의미부로 ‘女’가 붙어서 마치 시샘이나 질투가 여성의 특징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질투는 여성만이 아닌 인간의 속성이므로 ‘돌 석石’이라는 소리부 옆에 ‘女’라는 글자 대신 ‘사람 인人’을 붙였어야 했다. 하나의 말인 것처럼 생각하거나 그저 질투라고만 하기도 하는 시기·질투는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다고 배웠다. 질투란 다른 이와 견주어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고, 시기는 다른 이가 가진 것에 기분 나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타인을 향하여 발산될 때 이는 ‘부정不淨적인 욕심이나 욕구’로 표출된다. 질투는 그리스도교 역사와 인격 형성에서 크게 경계해야 할 악덕이다. 가톨릭교회는 질투를 일곱 가지 큰 죄 중 하나라고까지 말하며, 단테의 <신곡>은 질투의 시작이 눈이므로 연옥편에서 눈을 꿰매는 형벌로 정죄淨罪하게 한다. 질투의 유형이나 표출은 시대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희랍어 크로노스(χρόνος/chrónos, 물리적 시간, 연대기적 시간, 날짜와 시간, 객관적 시간)와 대비되는 카이로스(καιρός/kairós, 기회, 때, 시대, 의미의 시간, 주관적 시간)에서 생겨난 말 카이로로지(Kairology)를 사는 이들, 적어도 이를 살려고 노력하고 훈련하는 이들은 시대의 표징을 알아듣고, 역사와 사회의 체험에서 그때그때 생겨나는 병폐를 의식하며, 이를 사람들에게 알려 함께 살아가기 위한 처방을 논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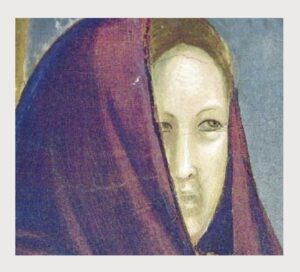 불과 3년 전, 지구라는 이 별 위의 인류는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는 슬픔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를 접하는 섭리 안에서 아주 잠깐, 인간이 절대로 혼자서는 살 수 없으며 인간과 자연이, 그리고 인간끼리 어떻게 공존 공생해야 하는지를 체험했다. 그런데도 어느 새인지 옛 일상을 되찾은 인간의 세상에는 시기와 질투가 만연하다. 아픔 속에서도 살아남았고, 공포와 두려움에서도 헤어날 수 있었으며, 다시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고 있음에, 생태生態에 감사할 줄 모른다. 감사가 없으면 질투가 쉽게 자라고, 질투가 자라나면 감사를 차츰 잃어간다. 질투의 반대편에 있는 개념은 ‘감사’이다. 다른 이의 불행을 먹고 자라나는 질투에 감염되면 감사라는 해독제를 복용해야만 한다. 우리가 익히 들어 외웠던 “내일 지구의 종말이 다가와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말로 유명한 스피노자(Baruch Spinoza, 1632~1677년)는 “질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타인의 불행이고, 가장 싫어하는 것은 타인의 행복이다.”라고 말한다. 거의 매일 화가 나거나 타인의 성공이 불편하고, 우울하고 낙담하며 이를 파괴하고 싶어 하는 이들을 마주친다. 온갖 매체에는 시기와 질투, 미움이 넘쳐난다. 미움과 증오의 시대이다. 질투는 파괴적인 감정이다. 타인이 지니고 있으나 나는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시기심이 나를 괴롭힌다.
불과 3년 전, 지구라는 이 별 위의 인류는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는 슬픔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를 접하는 섭리 안에서 아주 잠깐, 인간이 절대로 혼자서는 살 수 없으며 인간과 자연이, 그리고 인간끼리 어떻게 공존 공생해야 하는지를 체험했다. 그런데도 어느 새인지 옛 일상을 되찾은 인간의 세상에는 시기와 질투가 만연하다. 아픔 속에서도 살아남았고, 공포와 두려움에서도 헤어날 수 있었으며, 다시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고 있음에, 생태生態에 감사할 줄 모른다. 감사가 없으면 질투가 쉽게 자라고, 질투가 자라나면 감사를 차츰 잃어간다. 질투의 반대편에 있는 개념은 ‘감사’이다. 다른 이의 불행을 먹고 자라나는 질투에 감염되면 감사라는 해독제를 복용해야만 한다. 우리가 익히 들어 외웠던 “내일 지구의 종말이 다가와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말로 유명한 스피노자(Baruch Spinoza, 1632~1677년)는 “질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타인의 불행이고, 가장 싫어하는 것은 타인의 행복이다.”라고 말한다. 거의 매일 화가 나거나 타인의 성공이 불편하고, 우울하고 낙담하며 이를 파괴하고 싶어 하는 이들을 마주친다. 온갖 매체에는 시기와 질투, 미움이 넘쳐난다. 미움과 증오의 시대이다. 질투는 파괴적인 감정이다. 타인이 지니고 있으나 나는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시기심이 나를 괴롭힌다.
‘부러우면 진다’라는 말도 있듯이 부러움은 자칫 무력감을 낳고 시기와 질투로 나아간다. 자기 확인과 자기 한계, 그리고 자신의 가능성과 타인의 가능성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잡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질투를 라틴어로는 invidia라고 한다. in+videre, 곧 ‘보다’라는 뜻의 어근인 videre에 이를 부정하는 in이라는 접두어가 붙어있어서 ‘보지 못하(게 하)는’이라는 뜻이 된다. 질투는 이처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아주지 못하고 타인이 잘난 것을 눈꼴 사나워하면서 스스로 괴로움을 산다. 질투의 결과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맹목盲目’이 파생하고, 자신을 보지 못하는 데서 옮겨가 타인에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집착하는 우둔함으로 변질된다. 그렇게 질투는 미움이 된다. 이때 미움은 상처를 주고 위해危害를 가해온 원수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싫어서 상처를 주고 상대방을 죽이는 미움이다. 형 카인이 동생 아벨을 보고 “몹시 화를 내며 얼굴을 떨어트린” 나머지 동생을 죽인 것처럼(참조. 창세 4,4-8), 야곱의 아들 중에서 요셉을 봐줄 수 없고 미워한 나머지 그를 제거하고자 했던 다른 형제들처럼(창세 37,2-20), 시기와 질투는 항상 자기 자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누군가 다른 이의 자리를 탐하며 제거하려 든다. 이처럼 시기와 질투는 자기 현실에 대한 항의이고 주어진 것에 대한 거부이다.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고 ‘주어진 대로’ 살아야 한다. 수도 생활을 제도적으로 법제화했던 베네딕토 성인(St. Benedictus de Nursia, 480~547년)께서 공동체 안에서 일치와 형제애를 깨트릴 수 있는 위험을 경계하면서 주어진 소임과 각자의 한계를 누누이 강조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시기와 질투는 감사를 허락하지 않는 치명적인 병이고, 감사가 깊이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질투나 시기는 자리 잡을 곳이 없어진다.
함께 사는 이들에게도 감사할 줄 모르고,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땅에도 감사할 줄 모르며, 하늘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세상이다. 감사는 이 세상에 시급히 투약해야 할 덕목이다.(*이미지 출처-www.ilblogdienzobianchi.it)